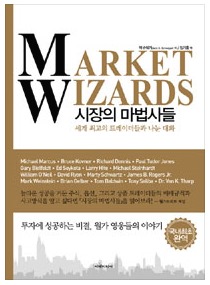|
(서울=연합인포맥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고령화, 극심한 내수침체로 요약할 수 있다. 수출호조로 국가 경제 지표는 무리가 없지만 정작 국민의 생활경제는 침체의 그늘에 빠진 것이다. 나라 곳간은 넉넉한데 왜 내수는 살아나지 않을까. 이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가 극명하게 나누어진 상황에서 경제주체인 가계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다. 100세 시대로 대표되는 고령화도 소비 침체를 자극한다. 은퇴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연금과 보험에 돈을 묶어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고령화 때문에 한국의 소비가 침체에 빠지고, 이것이 바로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IMF 이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 이러한 'IMF 트라우마' 때문에 대기업들은 곳간 풀기를 주저하고 있다. 현금만이 절대선이라는 원칙 아래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니 고용이 얼어붙고 많은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는 우리나라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도 비슷한 실정이다.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 문제는 최근 미국에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의 핵심은 소득불균형 문제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고통받는 미국 중산층'이라는 기사에서 미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한파' 때문이 아니라 중산층 감소로 인한 소비 동력의 약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진 게 미국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다.
일본은 고령화와 젊은층의 고용 불안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멈춰질 위기다. 기업들은 아베노믹스 덕택에 기사회생했으나, 정작 경제 선순환 고리를 이어줘야 할 임금 인상과 정규직 채용은 꺼리고 있다. 젊은층은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회에서 경제활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유럽에서는 20%가 넘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유로존의 25세 미만 청년실업률은 23.5%이고 이탈리아의 청년실업률은 무려 43.3%에 달한다. 양극화와 고령화, 청년실업 등 경제구조의 모순은 각종 경제 불평등을 양산하고, 이는 소비 침체를 유발해 내수를 좀먹는 요인이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30년간 빈부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소득불균형과 경제불평등이 세계화됐다는 의미다. 소득불평등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라별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면 전 세계 정책당국이 연대할 필요도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 경제가 회복돼도 미시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힘들다면 성공한 경제라고 할 수 없다. 세계 경제의 컨트롤타워는 바로 이 지점부터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돈을 풀어 거시경제 지표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경제의 온기가 바닥으로 퍼지지 않고 있다. 유럽도 돈을 푸는 형태로 경기부양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물경제 회복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돈을 풀어 거시경제를 살리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다 차원높은 해법이 필요한 시기다.
(국제경제부장)
(서울=연합인포맥스)
jang73@yna.co.kr
(끝)
출처 :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