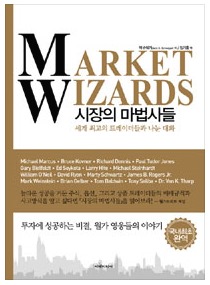파키스탄군이 와지리스탄에서 공세를 취하자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한층 치열해졌다. 미군은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추격하면서 무인항공기를 최대한 활용한다. 네바다에서 조종되는 ‘미래의 무기’, 무인항공기는 민간인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안긴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전쟁터를 넘어 유럽 교외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2009년 8월 5일 새벽 1시 30분경, 미국의 무인항공기에서 발진한 두 기의 헬파이어 미사일이 파키스탄 남와지리스탄의 한적한 마을 라다에 떨어졌다. 탈레반을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 이크람 우드 딘이 은둔한 집을 겨냥한 미사일이었다. 그 공격에 파키스탄 탈레반 지도자 바이툴라 마흐수드를 비롯해 12명이 희생됐다.
2009년 7월 22일에는 오사마 빈라덴의 아들 사드가 미국의 공격에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미국은 그 발표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월 1일에는 알카에다 외부작전 사령관으로 지난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을 테러 공격한 주범으로 추적당하던 오사마 알키니의 사망 소식에 미국은 무척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랜드연구소의 지역전문가 크리스틴 페어는 “무인항공기가 알카에다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다. 핵심적인 인물을 제거했고, 알카에다 대원들을 여러 부족 지역에서 몰아냈으며, 그들의 작전 역량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한 공격이 지난 몇 달 전부터 파키스탄의 부족 지역들에서 강화됐다. 알카에다 전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탈레반 등 모든 저항세력을 상대로 무인항공기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에서 제1공적으로 손꼽히던 인물의 제거는 중요한 인물들을 표적 삼아 공격한 이 전략에서 가장 눈부신 성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얼굴 없는 기계의 학살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2004년에 시작된 이런 표적 공격은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수많은 부수적 피해가 뒤따랐다. 올해 초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1회로 공습이 강화된 탓에 2009년 9월 30일 현재 432명이 사망했다. 폭도만이 아니라 혐의만 있던 테러 용의자와 민간인도 포함됐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09년 6~7월에만 155명이 사망한 데 견줘 2008년에는 36회의 공격에 317명이 사망했다. 무인항공기가 첫 표적으로 삼은 곳은 파키스탄 남부 남와지리스탄의 산악지역이었다. 물라인 나지르, 바이툴라 마흐수드, 그리고 옛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잘랄루딘 하카니의 이름을 딴 하카니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수천km 떨어진 미국 네바다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중앙정보국(CIA)이 무인항공기를 조종한다. 모니터로 꽉 채워진 밀폐된 공간에서 컴퓨터 자판과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말이다. 조종사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는 무미건조한 공간에서 항공기가 조종된다. 위성 안테나가 장착된 까닭에 앞쪽은 불룩하지만 날렵하게 잘 빠진 긴 기체, 좁은 날개와 뒤로 굽은 방향타 탓에 무인항공기는 무시무시한 벌레처럼 보인다.
이런 원거리 전쟁에도 문제는 있다. “원거리 전쟁으로 전투원의 ‘최종 행위’, 즉 죽음을 안기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전쟁은 사무실의 일상적 업무, 게다가 비디오게임이 돼버린 것일까? 무책임한 행동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펜타곤은 표적으로 정한 지역에 4~6주 동안 조종사들을 반복해서 파견하기는 한다.”(1) 그러나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경제 논리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미국에서는 전투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 25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무인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13만5천 달러면 충분하다.(2) 그러나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외교협회의 정치학자 마이커 젠코는 “2008년 여름부터 부시 정부는 파키스탄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CIA를 공군 조직으로 개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CIA는 공격의 효율성이 공론화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공격을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미국 민간 보안회사로 이라크에서 적잖은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된 블랙워터가 그때부터 X라는 이름으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불법행위다.(3)
미국 민간 보안회사도 연루
 ▲ www.smartwar.net ▲ www.smartwar.net | ||
지난 몇 해 동안 미국은 무인항공기를 걸신처럼 개발해왔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무인항공기가 167대에서 6천대 이상 늘었다. 이런 폭발적 증가는 정찰 임무를 위한 소형 항공기 수의 급증으로 설명되지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도 아울러 증가했다. 2002년에는 프레디터가 22대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09대로 증가했고, 여기에 26대의 리퍼까지 추가됐다. 2009년 1월 작성된 한 상황보고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전체의 총 비행 시간이 2008년에는 40만 시간으로 2007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
미국은 무인항공기의 활용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예산에서 오바마 정부는 무인항공기의 개발과 구입에 38억 달러를 책정했다. 24대의 리퍼와 5대의 글로벌 호크를 구입하기로 한 결정이 주목된다. 이런 증가는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군사 예산이 74%나 증액돼 5150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2001년 이후 군사 로봇에 할당된 예산이 매년 배로 증가하며, 군사 로봇 산업을 태동시키는 산업적 효과까지 거두었다.
프레디터는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 기지에 배치돼 있다. 또한 조지 부시와 파키스탄의 전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암암리에 체결한 조약에 따라, 파키스탄의 기지에서도 프레디터가 작전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이슬라마바드의 안보문제연구소 임티아즈 굴 소장은 “마흐수드가 사망하면서 탈레반은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미국과 파키스탄이 공조 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고, 랜드연구소의 크리스틴 페어는 “파키스탄 군부는 무인항공기를 원했다. 무인항공기가 그곳에서 방아쇠를 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무인항공기의 공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상작전 명분 잃자 급부상
2009년 1월 23일, 오바마는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고 사흘 후 파키스탄의 부족 지역에 대한 공격을 명령했다.(4) 북와지리스탄을 목표로 한 첫 공습에 8명이 사망했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는 남와지리스탄에서 7명이 죽었다. 2008년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격이 총 36회였지만, 2009년에는 9월 30일에만 39차례의 공격이 파키스탄에 가해졌다. 지역 전문가 조제프 앙로탱은 “부시는 파키스탄을 다룰 때는 무척 신중했다. 오바마 정부의 경우는 문제가 훨씬 포괄적이다. 힘의 과시에서 극단적 형태를 띤다. ‘찾아내서 파괴한다’는 전략이다. 일종의 ‘추적권’을 되찾은 것이다”라고 말했다.(5)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 영토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되자 무인항공기의 활용을 정당화하려고 2008년부터 애썼다. 파키스탄 정부가 부족 지역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 것에 지쳐, 당시 부시 대통령이 특수부대에 파키스탄에 개입하는 걸 허락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해군 특수부대가 2008년 9월 국경을 넘어 들어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 20여 명을 살해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런 침략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다시 침략하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했다. 오바마 정부는 파키스탄 영토에서의 지상 작전을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가 미군의 향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앙로탱은 “무인항공기는 군인의 보조 수단으로 군인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지만, 2009년 발표된 미 공군의 한 보고서는 “무인항공기 체제를 더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해 공군을 더 융통성 있고 조직적으로 바꿔가는 방향으로, 요컨대 21세기에 공군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군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무인항공기는 전통적으로 인간이 수행하던 임무를 대신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고 분명히 말한다.
결국에는 무인항공기가 전투기를 대신하게 될까? 그럴 수도 있다. 미 공군의 보고서는 “무인항공기는 미래의 전장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역설하며, 미래에는 무인항공기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상황을 예상해보기도 했다.(6)
여러 나라가 이미 전투용 무인항공기의 개발 프로그램에 뛰어들었다. 지상 공격과 폭격만이 아니라 공중전까지 감안한 무인항공기가 개발되고 있다. 아직 미국이 앞서가고 있다. 노스롭그루먼의 무인폭격기 X-47 B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프랑스도 이미 사용 중
마약과의 전쟁이나 밀입국 등과 같은 다른 안보 대책에도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확대하는 계획이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무인항공기가 감시작전에서 이미 사용됐다. 2008년 9월 14~15일 교황 베네딕토 14세가 루르드를 공식 방문했을 때 교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동원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때 소형 무인항공기 엘자가 스트라부르의 항공을 선회했다. 민간용 무인항공기의 개발도 곧 현실화되리라 여겨진다.(7)
지금으로서는 운영적인 면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무인항공기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 표적 공격이 정말로 효과적일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공격이 폭도들의 적개심만 키워놓은 듯하다. 마흐수드가 사망한 후, 테러리스트의 하부구조는 2만7천㎢의 부족 지역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고, 경제·사회적 조건은 더욱 급진화됐다.(8) 또한 무인항공기의 공격은 파키스탄 국민의 원망까지 불러일으켰다. 예부터 부패한 정부를 규탄하던 여론이 이제는 공권력의 정통성에 화살을 겨누는 실정이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오바마의 미국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오바마에 대한 호의적 여론은 조지 부시가 가장 낮았을 때의 수준을 겨우 넘어서고 있을 뿐이다. 마이커 젠토는 “무인항공기가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글·로랑 셰콜라·에두아르 플림린 Laurent Checola·Edouard Pflimlin
번역·강주헌 2nabbi@ilemonde.com
불문학 박사 출신의 문화비평가 겸 번역전문가. <선물> <해리 포터 철학 교실> 등 100여 권의 번역서를 펴냈다.
<각주>
(1) Martin Crag, ‘Drones: le nouveau jeu de la guerre’, <사회와 과학>, 특별호, 파리, 2009.
(2) Frederic Lert, ‘Drones rechercent pilots’, 앞의 책.
(3) ‘CIA said to use outsiders to put bombs on drones’, <뉴욕타임스>, 2009년 8월 20일자.
(4) Tim Reid, ‘President Obama orders Pakstan drone attacks’, <타임스온라인>, 2009년 1월 23일.
(5) Joseph Henrotin, La technologie militaire en questuin. Le cas americain, 에코노미카, 파리, 2009.
(6) Nathan Hodge, ‘Unleashed the nuclear-armed Robo-Bombers’, <와이어드>, 2009년 6월 3일.
(7) ‘Dans l’attente des drones civils’, <에르 에 코스모스> 제2187호, 파리, 2009년 9월 2일자.
(8) Najam Sethi, ‘Le Pakistan se retourne contre les Talibans’,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9년 6월호.
무인항공기 시작을 거의 독점한 미국
2009년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은 약 44억 달러이다. 노스롭그루먼과 제너럴아토믹스 같은 미국계 회사가 이 시장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노스롭그루먼은 글로벌 호크(36시간 연속으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제너널아토믹스는 프레디터를 제작하는 회사다.
탈레스, EADS, 다소, 핀메카니카, 사젬, BAE시스템스 등 유럽계 회사들은 고작 4%를 차지할 뿐이다. 이스라엘 회사들이 2%를 차지하지만 유럽계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어, 그 회사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훨씬 중요하다. 예컨대 이스라엘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스(IAI)는 헌터(프랑스는 이 기종을 4대 구매했다)와, SIDM 하르팡 프로그램의 초석 역할을 한 이글을 제작했다. 또 다른 이스라엘 회사인 엘비트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무인항공기 헤르메스를 제작했다.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620억 달러를 넘어설 무인항공기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틸그룹은 2009년 연구 보고서에서, 무인항공기 시장은 향후 10년 안에 44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며 2만5천 대가 판매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에는 40억~50억 달러의 규모일 것이고, 3분의 1가량을 미국 밖의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1) HALE(고고도 장기체공)용 무인항공기의 경우 글로벌 호크를 앞세운 미국의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NATO군도 글로벌 호크를 채택했다. 고고도 무인항공기 시장쟁탈전에서는 유럽이 완전히 패배한 셈이다. 반면 MALE형 무인항공기의 시장에서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첨단 무인항공기를 개발한 EADS, 다소, 탈레스, 스페인의 인드라 등이 경쟁을 벌일 것이다. 현재 28억 유로짜리 개발 프로그램이 착수됐다. 개발비로 10억 유로, 15기종으로 3대씩 제작하는 비용으로 18억 유로가 책정됐다.
전투용 무인항공기 분야도 남아 있지만, 유럽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국과 독일이 참여하지 않아 다소가 추진하는 뉴런 프로젝트의 진행은 지지부진한 편이다.
<각주>
(1) ‘La guerre des drones aura bien lieu’, Armees.com, 2009년 6월 29일.
'배움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91218 - 스포츠 서울 김장훈, 기부액수 80억원 넘었다! (0) | 2013.10.21 |
|---|---|
| 20091210 - Nate News [사회]세상을 바꾸는 ‘착한 디자인’ (0) | 2013.10.21 |
| 20091202 - 이슬람 금융(Islamic Finance) -슬픈한국 (0) | 2013.10.21 |